
영화 때문에 굳이 소설 소개는 안 해도 되겠죠. 평소 브래드 피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제일 인상 깊었던 게 세븐 몽키즈..) 대작의 스멜이 난다! 싶어서 영화도 소설도 기대했습니다.
물론 영화가 원작 소설보다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다든가 라는 말은 굳이 이 작품만이 아니라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 작품은 더하더라구요. 그야말로 설정만 따다 온 다른 작품(문제의 해결방식이 다르니 스핀 오프라고 할 수도 없는)이었습니다.
영화는 일단 뭐, 주로 영상미에 치중할 수 밖에 없겠죠, 할리우드 영화인데. 매체의 한계를 생각하면, 몇부작 구성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아닌 바에야 러닝 타임 안에 좀비를 물리칠 방법을 제시해야 했을테고.
결국 다른 재난 영화와 같이, 가족애 넘치는 미쿡 남성이 고생 끝에 인류를 구할 수 있는 힌트를 얻었다! 라는 흔한 스토리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성벽을 덮치는 좀비떼라던가, 신나게 달려오는 좀비떼 등의 영상에서 영화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뭐.. 제가 긴장해서 본 건 WHO B동 장면 뿐이었지만요.
그리고 다른 좀비물을 안 봐서 잘 모르지만, 좀비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다는 게 흔한 설정인지? 소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을 땐 좀비 밀도가 적은 지역을 경보로 걸어라- 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물론 뛰어댕기는 쪽이 더 무섭죠. 좀비 자체가 자연의 규칙을 거스르는 존재니 뭐든지 OK일 수야 있지만. 못 헤엄치고 못 날아댕길 건 뭐랍니까.
…영화 이야기는 여기까지. 그래서 영화를 본 후 읽은 소설은 어땠냐. 정말이지 ‘세계’ 대전이라는 제목에 걸맞는 소설이었습니다.
좀비라는 공포의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류가 통제할 수 없는 대재앙’이, 그것도 빠른 속도가 아니라 충분히 공포를 야기시킬 수 있을 정도의 느린 속도로 다가올 때 인간성과 사회가 어떤 식으로 무너질 수 있는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그려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볼륨도 꽤 나가고요. 물론 후반부로 갈 수록 지겨워지기 시작해서 두 번이나 읽다가 그냥 자버렸을 정도지만 ^^; 이 인터뷰 형식에 대해 정신 사납다든가 익숙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런 다양한 입장에서 기술한 전쟁이었으니까 ‘세계’ 대전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지 싶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미국 전쟁이죠.
2차 세계 대전 후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냈으나 현재는 ‘자유주의와 과학 기술을 맹신하게 된 미국사회’가 어떤 식으로 무너졌는지, 투표율을 신경쓰느라 제때 처리 못한 정부라든가, 그동안 과대 평가를 받아온 반작용으로 아무런 힘을 못 썼던 CIA에, 이때다 싶어서 가짜 백신을 공급한 연구자와 제약회사와 FTA 등의 사혹 등등.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정도 나오는데 한국인으로서 가장 흥미깊었던 건 역시 북한 에피소드. 뒷표지에 바로 스포일러가 나와서 깼습니다만(…). 출판사 입장에서는 북한 에피소드를 표지로 내세워야 많이 팔릴 거라는 계산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지만;;
하지만 북한뿐만이 아니라 남한에 대해서도, 남한의 젊은 세대의 북한에 대한 인식 같은 부분에서는 나름 작가(건 편집자건)가 조사를 많이 했구나!! 싶었습니다.
반면 영화에서 ‘호우가 죽죽 내리는(장마철이라고 치고;), 민가가 총으로 감염자를 헛간에 처넣은 남한(그건 대체 어느 나라여…)’이 나왔던 걸 생각하면 정말이지 ㅡ_ㅡ 나름 한국 나왔다고 감독이랑 빵 아저씨가 내한은 하셨지만;
그 외에 일본의 ‘오타쿠’에서 뿜었고. 오타쿠에도 여러 분류가 있지만 여기에서 그려지는 이미지는 히키코모리+밀덕+크래커 가 1:1:1의 비율로 섞였더군요 ^^; 원래 작가가 가진 이미지가 그런지 그 쪽이 이야기 풀기가 쉬워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올해 상반기에 읽었던 책 중엔 ‘이거다!!’ 싶은 게 없었는데, 올해 하반기 최고의 책은 이 작품이 될 거 같군요. 외전도 있는데 읽어야겠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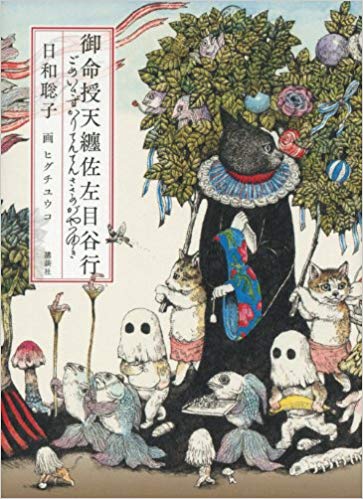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