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에게 광증을 퍼뜨리는 아포(芽胞)로 가득찬 지상 세계. 사람들은 어둡고 퀴퀴한 지하 도시로 떠밀려와 반쪽짜리 삶을 이어간다. 형편없는 음식에 만족하며, 혹여라도 광증에 걸릴까 두려워하며. 하지만 태린은 누구보다 지상을 갈망한다. 그에게 일렁이는 노을의 황홀한 빛깔과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별들의 반짝임을 알려준 이가 있었기 때문에. 태린은 스승 이제프처럼 파견자가 되어 그와 나란히 지상에 서고자 한다. 파견자는 지상을 향한 매혹뿐 아니라, 증오까지 함께 품어야 한다는 이제프의 조언을 되새기며. 파견자 최종 시험을 앞둔 어느 날 태린에게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태린은 자신이 미친 게 아닐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데…… 이 목소리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우주로부터 불시착한 먼지들 때문에 낯선 행성으로 변해버린 지구, 그곳을 탐사하고 마침내 놀라운 진실을 목격하는 파견자들의 이야기.
*
김초엽 작가의 작년 신작입니다. 딱히 이 작가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지난 달 yes24 사은품 중 산리오 아크릴 북스탠드 대상 도서에서 살 책을 찾다가 골랐어요(쿨럭). 그래도 그나마 한국 SF 작가 중엔 김초엽 작가를 읽는 편이라.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으로 잘 알라진 작가이고, 저도 이 단편집을 읽었을 때 작가의.. 먼 미래에도 여전히 통용되는 현대 사회의 경제 법칙-부동산 문제라든가, 수요가 없어져 폐선된 우주 항로라든가-를 소재로 한 것 때문에 감탄했었고(심지어 이 작가는 공대 출신임!), 재밌게 읽었는데
단편 말고 중편/장편은 기대보다는 별로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장편 소설도 처음에 살 생각은 안 했던 것이고.
중편(원통 안의 소녀)도 장편(지구 끝의 온실)도, 인간이 오롯한 몸으로는 살 수 없게 되어버린 미래사회에서 인간은 어떻게 사는가 라는 내용이 주제였는데, 위에 썼듯이 제가 이 작가에게 기대했던 건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내용이 아니었던지라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것.
이번 장편도, 범람체라는 미지의 생물이 퍼진 지상 세계에 도전하는 태린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범람체는 진균 같은 거라, 인간이 거기에 감염되면 미쳐버리고, 또 다른 지상생물-동식물 상관없이-도 감염? 기생?시켜서 하나의 생물군처럼 존재한다는 설정인데 읽으면서 이런 외계 식물(?) 이야기는 바디 스내쳐나 트리피드로 시작하는 유구한 역사가 있으니 별로 새로울 것도 없다 싶었어요.
그나마 중후반에 이 범람체의 비밀이 밝혀지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되면서 좀 재밌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 작가는 단편이 제일 재밌다라는 생각에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
다음 장편은 최소한 인간이 살지 못하는 바깥 세상이라는 디스토피아 설정은 빼고 다른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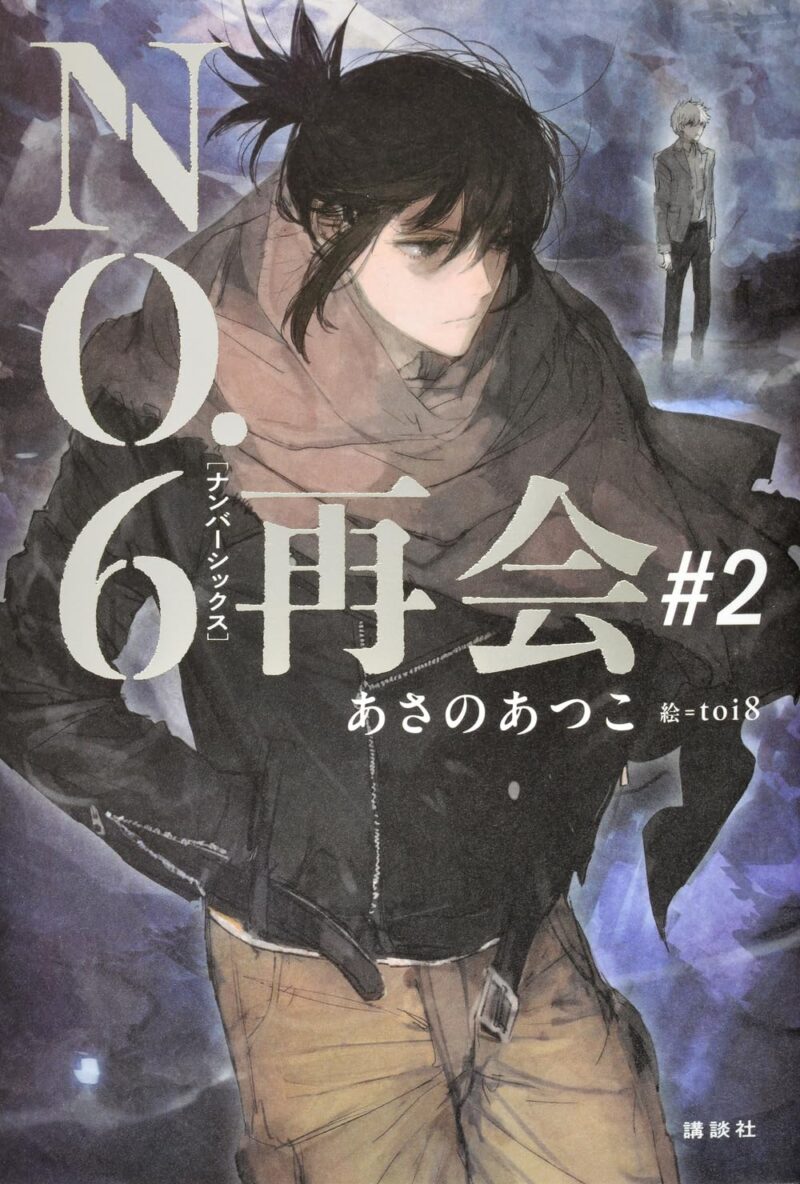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