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탕한 생활을 하며 로데오를 즐기는 전기 기술자 ‘론 우드루프’(매튜 맥커너히)는 어느 날 의사 ‘이브 삭스’(제니퍼 가너)로부터 에이즈진단을 받게 된다.
그에게 남은 시간은 단 30일…!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던 ‘론’은 치료제로 복용했던 약물이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자국에서는 금지된 약물을 다른 나라에서 밀수해 들여오기 시작한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알게 된 에이즈 감염자 ‘레이언’(자레드 레토)과 함께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을 만들고, 회원제로 자신과 같은 병을 앓는 환자들에게 밀수한 치료 약물을 판매하기 시작하는데…
*
평소 친구가 극장 가서 영화 보자고 할 때, 로맨스가 아닌 이상은 스케쥴만 허락하면 OK!를 외치는 인간이라, 이 영화도 시놉시스는 안 읽고, 단지 예고편만 보고서 ‘로데오 선수가 폐암에 걸려서 30일 시한부 선언을 듣고 보여주는 인생극장인가?’ 라는 정도의 생각만 하고 봤습니다. 왜냐면 예고편에서 내내 기침하잖아요;;
하지만 실제 내용은, ‘왜 거기에서 약 장사를 시작해?;;;’.
전형적인 텍사스 마초였던 주인공이, 제약회사와 FDA의 음모를 뚫고 에이즈의 신약을 밀수해서 팔게 되면서, 신약을 알리는 일에 소명을 갖게 되고, 인격적으로도 성장을 하고, 결국 7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일종의 영웅담 되겠습니다.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조연상을 휩쓴 작품이라, 원래대로라면 여기에서 배우의 연기에 대한 이야기나 실존 인물들과 어떻게 다른가 등을 이야기해야겠지만 이 블로그가 영화 블로그도 아니고(의학 블로그도 아니지만)..
단지 의사, 그것도 에이즈는 아니지만 신약 개발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항암제를 처방하는 과에 몸담고 있던 입장에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뭐 본질적으로는 TV 의학 드라마를 보고 ‘저건 말도 안 돼!’라고 외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가 길어지니 귀찮으신 분은 ‘뒤로가기’를.
하지만 그래도 이 문장은 읽어주세요. AZT는 지금도 AIDS 치료의 1차 선택약제입니다.
(AZT라고 해서 처음엔 어디서 많이 들은 이니셜이다 정도로 생각했는데, Zidovudine이라네요)
*
1. 이중 맹검법(Double-Blind)
영화 초반에 주인공에게 AZT 임상 시험을 권유할 때, 이중 맹검법이라 위약이 들어갈지 모른다고 여주가 말합니다. 그에 비해 여주의 상사는 ‘위약’에 대한 이야기는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암시가 나오는데..
이중 맹검이 뭔지 영화에서는(당연히) 설명은 없는데, 뭐 약 주는 의사도 받는 환자도 먹는 약이 진짜 약인지 위약인지 모르게 하는 실험입니다. (그러므로 병원 직원이 빼돌린 약도 위약이었을지 어떤지 모르는 게 맞는 것임)
현재의 감각으로는 당연히 위약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환자에게 밝혀야 하지만, 시대는 1985년 이후.
Tuskegee syphilis experiment가 터지고 헬싱키 선언이 리뉴얼 된 이후라고는 하지만, 임상 실험에서의 인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위약일지도 모르지만’이라고 투여하는 게 얼마나 배려없는 건지도 나와있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새 치료법’과 ‘기존 치료법’을 이중 맹검으로 비교합니다..
*
2. 정부와 제약회사의 이해 관계
FDA에서 신약의 사용을 금지시킨 이유를, 영화에서는 제약회사에게 뒷돈을 받아서.. 라고 암시합니다. 여주가 이중 맹검법 이후 바로 임상 투여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장기적 부작용도 고려 안 하고 너무 급하다’라고 의문을 제시하는 대사도 있고요. 제 3상 임상실험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zidovudine은 AIDS에 대한 실험 실시 이후 FDA 승인까지 25개월밖에 안 걸렸고, 역사상 가장 짧았다고 하네요. (출처: 위키페디아)
영화에서 암시하는대로 이해관계도 있었을 거고, 또 AIDS의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다보니 급하게 내놓을 수 밖에 없었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FDA는 입장상 주인공의 주장만 믿고 신약 허가를 내줄 수는 없었겠지요. 아무리 외국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해도 FDA는 자신의 기준이 있었을 거고. 실제로 그런 입장을 고수한 덕에 신약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던 가장 유명한 예가 Thalidomide입니다.
*
3. 신약의 현실과 이상의 차이
그나마 주인공은 외국에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약물을 들여온 거지만, 처음 그것으로 한 것은 결국은 장사였지요.
저는 AIDS 환자는 못 봤지만, 암환자는 많이 봐왔고, 환자와 보호자가 초기에 얼마나 이런저런 ‘신약’에 매달리고 싶어하는지, 그것을 노린 장사(사기)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는지 봤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부정한 AZT… 위에 썼지만 아직도 1차 치료제로 쓰입니다. 물론 초기에 언급되는 많은 부작용 때문에 저용량으로, 다른 약과 동시투여하는 방식으로 쓰이죠.
영화 마지막에 나오는 자막에는 이 동시투여법이 마치 주인공의 노력의 산물이라는 식으로 나옵니다만, 오히려 주인공은 AZT의 부작용으로부터 다른 환자들을 지켰을지는 몰라도 결국 가장 효과적인 약물을 투여받지 못하게 했다는 이야기도 되지요.
주인공이 AIDS 선고받고 7년 버텼다는 것도, 신약의 효과도 있었을지 몰라도, 자기가 면역력 유지하려고 관리 잘 해서 그런 것도 있을테고. 원래 AIDS 걸린다고 바로 안 죽어요. 면역력이 떨어질만큼 떨어지면 다른 질병에 걸려서 죽는거지.
투여 허가가 나기 전부터 환자들에게 투여되어서, 의심할 여지 없이 놀라운 효과를 본 약.. 글쎄요, 글리벡 정도 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
*
영화는 정부와 제약 회사의 음모에 맞선 영웅담…. 을 그렸던 거 같은데,
그것을 보는 저는 그 둘의 이해 관계도 관계지만 신약 개발과, 불치병을 둘러싼 여러가지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떠오르게 해서 불편했습니다.
의약청 허가는커녕 보험 안 되는 항암제 때문에 심평원과 환자하고 싸워보라고… (심평원이 딴지거는 게 항암제뿐만은 아니지만)
이상한 거 먹겠다고 하는 암환자 말려보라고…
p.s: 아, 그래도 영화 자체는 재미있어요. 동행이 올해 본 영화(오직 사랑하는 자들이~, 미하엘 칼리스의 선택, 폼페이)중 제일 재미있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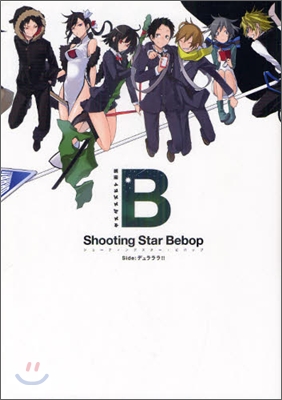


comments